| エトランゼ(TANAYAMIX) Etranger(TANAYAMIX) 에뜨랑제(타나야믹스) |
ⅰ
음악도 듣는것만 자꾸 듣게 되어서 가끔은 '오늘은 자주 듣지않던 CD를 한번 찾아서 들어볼까'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어 꽂혀있는 CD를 눈으로 훑어내려가는데‥ 그럴 때 가끔 난감한 경우를 맞닥뜨립니다.
'아, 맞아! 거의 듣진 않았지만 이런 CD도 있었지,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싶은 마음에 꺼내서 수록곡 목록을 살펴보면
열서넛이나 되는 수록곡 중에 멜로디가 흥얼거려지는 곡이 단 한 곡도 없는, 그래서 일순 당황스럽게 만드는 음반이거나
멜로디는 고사하고 그 앨범 중에 어느 곡이 타이틀 곡이었는지도 곡의 제목만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구입했을 당시에는 적어도 한번 이상은 들어봤을텐데, 다시 들어봐도 방금 새로 산 음반처럼 모든 트랙이 다 생소하지요.
음반 리뷰를 읽고 관심이 생겨서 샀는데 다소 과장되거나 필자의 개인 취향에 상당히 기운,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음반이었다든지
뮤지션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만 앨범 표지 디자인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거 뭐 있겠다' 싶었는데 '아차, 속았다' 였다든지
제 값이면 그냥 지나쳤을 음반인데 폐업 직전의 매장에서 「50% SALE」이라는데 혹해서 구입했던 음반들 중의 이것저것.
이를테면 사이겐지(Saigenji)라는 일본 기타리스트의 앨범 등과 같은 CD들이 제게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낯선 CD'보다 더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기만 해두고 읽지 않고 어쩌다 그만 잊혀진 책들입니다.
적어도 한번은 들어봤을 CD와 달리 겉표지의 카피 정도만 읽고는 잠깐 미뤄둔 것이 그만 계절과 해가 바뀔 때까지 내버려둔 책들.
당장 눈에 띄는 걸로 뭐가 있나 싶어 책꽂이로 고개를 돌려보니, 캐럴 앤셔(Carol Anshaw)의 소설 아쿠아마린(Aquamarine).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인 레즈비언·게이 문학이라 해서 눈길이 갔고 출판사도 신뢰를 할 만한 곳이라서 샀던 책인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주말 하루 이틀 한 나절만 시간 내면 되는 분량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벌써 두 해나 넘겨버렸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DVD도 그렇네요. 12장짜리 DVD 박스세트 하나는 제 책상 위에서 엉뚱하게 북엔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타카하타 이사오(高畑勲) 감독이 연출한 모두 50화 분량의 TV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赤毛のアン).
저 DVD 박스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의 심정은 분명 몇날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당장 한번에' 해치울 듯 했을텐데 말입니다.
다시 눈에 띈 지금도 기약없기는 마찬가지. 일단 6장짜리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씨즌2부터 끝내야 해서요. ^^
이런 CD, 그런 책, 저런 DVD를 쳐다보면서 몇가지 상념에 잠깁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들을 음악이, 읽을 책이 그리고 볼거리이 넘쳐나는 것인지‥.
한번 언뜻 읽고 설핏 듣고 흘낏 보고 지나치기에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니.
제 능력으로 봐도 제대로 소화는 커녕 주마간산(走馬看山) 정도의 맛보기도 쉽지 않을 듯 싶은데
욕심만 부려서 결국 방 안 여기저기 쟁여 두는 꼴만 되었지 사실 '알맹이'는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한편 이걸 듣고 그걸 읽고 저걸 본다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무슨 큰 의미를 가지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냐고‥. |  |
ⅱ
한때 음반과 책이 제가 가지고 있던 유형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생기는대로 레코드숍과 서점으로 달려가서 용돈 전부를 거기다 쏟아부었던 미성년의 시절.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엥겔계수처럼,
용돈에서 음반 구입비와 서적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실제 지출되는 절대비용은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여전히 (그리고 주저없이) 그것은 음반과 책들이었습니다.
어느 해던가 이사를 하고나서 가구 등 대강의 큰 정리를 마친 후 음반을 정리하려다가,
알파베트 순으로 제가 따로 포장해둔 음반 중에서 하필이면 「B」항목의 꾸러미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의 낭패감이란‥.
그렇게 사라져버린 비틀즈(The Beatles)의 LP들.
특히 레어 아이템이 되어버린 '미국 발매'의 앨범 Rarities. (나중에 CD로도 구할 길이 없게 된)
LP든 CD든 구분없이, 음반이라면 그리고 책이라면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 손에서만 귀할 뿐, 관심없는 사람에겐 재활용도 곤란한 중고 물품이나 무게로 가격을 매기는 폐지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인데.

The Concert
for Bangla Desh | 음반 컬렉션의 집착(?!)에서 한두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진집까지 포함된 3장짜리 LP 박스세트 The Concert for Bangla Desh였습니다.
저의 LP 컬렉션에서 그 음반을 발견한 친구 녀석이 그것을 달라고 졸라 대던 어느날.
아끼고 아끼던, 일본 발매의 수입 LP 박스세트였던 그 음반을 결국 옜다 하고 그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조르거나 하면 그럴 때마다 많은 LP들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조만간 이사를 가야한다든지 하는 일정이 나올 때면 (한참의 고민 끝에) 버려지는 LP까지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면 책부터 정리해서 버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즈음부터인가 싶습니다. |
그다지 큰 미련없이 제일 먼저 버려진 것은 계간지나 월간지 같은 정기간행물이었는데,
주로 헌책방을 통해서 과월호로 모았던 영화잡지 월간 KINO.
문학 계간지보다 더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버틴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한 권도 남김없이 모두 버려졌습니다.
대학시절 구입했던 ○○○개론 또는 ○○○입문 등의 책들 역시 저에게 일찌감치 버림받은 책들입니다.
낱권으로 산 책과는 달리 전집이라면 그 중에서 잊혀진 채 먼지 쌓이는 것이 한두 권 이상 꼭 있게 마련이죠.
제게는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전집이 그러한데 잊혀진 정도를 넘어 아예 없기까지 합니다.
살 때는 큰 마음 먹고 목돈을 지불했던 것인데, 그 중의 몇 권은 읽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책꽂이의 어느 부분은 마치 이빨 한두 개가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라도 한번 읽어보려면 재간행된 단행본으로 그 책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집의 남아있는 '이빨'들도 조만간 버려질지 모르니까요. |  |
ⅲ
 | 얼마 전 어느 주말, 명동역 근처 회현지하상가에 있다는 중고 LP 레코드숍 두세 군데에 들렸습니다.
얘기는 들은 적 있지만 직접 가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했지만
가볍게 들고 갈 분량을 훨씬 넘어서는 LP를 팔려면 매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도 있었서요.
장르가 주로 어떤 쪽이고 분량은 어느 정도 되냐고 묻길래 대부분 가요 음반이라고 하니까
한 장 당 후하게 쳐주면 천원, 흔한 것은 이삼백원 정도인데, 일단 가져오는 건 전부 구매해준다더군요.
이문세나 변진섭처럼 수십만장 팔렸던 시절의 것은 가격을 거의 기대하지 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차에 싣고 와서 정차하고 연락 주면, 살펴보고 매입 가격을 정하는 건 십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
가격 매김에 있어서 음반의 보존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레어 아이템'이란 것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한편 '언젯적 음반'인지 물어보면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80년대 음반은 돈이 안된다는 등, 미리 못을 박아두는 듯한 얘기에서
음반 시장 특히 가요 음반의 황금기였던 시절이 중고 LP의 최저 가격을 가리키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고 LP라고 하는 취급 물품의 특성 상, 구매 계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게다가 앞으로 아마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일테고)
구매자들의 취향도 제각각이라 매입으로 잡았다가 원매자를 만나지 못하면 자칫 악성 재고로 안고 가야 하는 위험부담도 있고
매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대료 등 기본적인 경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매입 가격을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손님들이 찾을 만한 것 말고 엔간한 것은 한 장에 고작 이삼백원 정도로 밖에 쳐줄 수 없다니‥.
그러니까 '엔간한 것'이라고 치부되는 음반이라면 그 LP의 그루브 라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
그 무형의 가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그렇다는 경제원칙에 의해) 아예 무시되고
그저 동그랗고 까만 비닐 판떼기라는 재활용품 정도의 가치로 환산되어 거래된다는 것이지요.
손님들이 찾을 만한 음반도 후하게 쳐서 천원 정도라니‥.
그렇다면 그런 것조차도, 재활용품의 가치는 넘어선다 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서로의 입장 차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한 장에 고작 이삼백원을 받고 제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니.
명함을 받고 돌아오는 길. 아직 팔지는 않고 그저 물어만 보고 오는 길인데도 기분이 착잡해졌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결국에는, 그 LP를 그렇게 떠나보낼 것이 분명해서 그랬나 봅니다. |  |
ⅳ
몇 번 밖에 듣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 CD. 읽는다 하고는 그만 잊고 쌓아둔 책. 욕심내서 사고는 아직 보지 못한 DVD.
듣고 읽고 볼 내용이 온전히 남아있으나 잊혀진 것이나 진배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 멜로디도 내용도 장면도 이미 다 겪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년 넘게 턴테이블에 올려보지 못한 LP. 너무 오래 꽂혀있어서 색이 바랜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이 확연한 책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싱글CD. 요즈음의 맥시 싱글CD가 아닌, 예전의 8cm 규격의 싱글CD.
LP에서 CD로 음반 매체가 넘어온지도 그게 언제인지 갸웃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CD조차도 mp3때문에 뒷전이 되어가는 요즈음이지만, 저는 아직도 되도록이면 CD로 음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음악을 들을 때는 거의 mp3로 들으니, mp3로 듣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집에서 느긋하게 자리잡고 앉아 오디오에 CD를 로딩시킬 여유가 점점 없어지다보니
결국 CD로 음악을 듣는 시간은 운전하는 동안의 차 안에서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流れ星

エトランゼ(TANAYAMIX)
愛のしるし (LIVE'98 version) | 차 안에서는 무엇보다 운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에서 듣는 음악은 평소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거의 듣지 않지만 차에서는 'BEST가요리믹스2'와 같은 CD도 흥겹게 듣습니다.
한편 싱글CD의 경우는 아무래도 앨범CD와 달리 자주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연주시간이 짧으니까요.
운전하면서 CD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되니까 두세곡 수록의 싱글CD는 피하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아주 피하는 건 아닙니다. KREVA의 싱글CD를 무한반복으로 들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차에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 CD가 있습니다.
스핏츠(スピッツ)의 20번째 싱글 流れ星(Nagare Boshi, 별똥별)와 같은, 8cm 규격의 싱글CD인데요.
'차에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카 오디오의 CD드라이브는 컴퓨터의 그것같은 트레이 방식이 아니라 슬립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슬립방식의 CD드라이브에 8cm 싱글CD를 넣으면 이젝트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을듯 싶어서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도 해 본 적 없거든요) |
그런 이유로 8cm 싱글CD는 차에서는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고, 집에서도 여유있게 들을 시간이 마땅찮을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결국 流れ星(Nagare Boshi, 별똥별) 같은 8cm 싱글CD는 컬렉션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싱글CD의 수록곡이라 해도 싱글 타이틀곡은 그 즈음에 (또는 오래지 않아) 발매되는 앨범에도 수록되게 마련이고
(물론 앨범 발매 시에는 싱글 버전과 다른 것으로 수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의 같은 곡은 아니지만)
8cm 싱글CD의 커플링곡도 스핏츠의 경우 B-SIDES 앨범 花鳥風月(Kachofugetsu, 꽃 새 바람 달)를 통해 재수록되었기 때문에
저는 카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앨범들의 트랙을 통하여 8cm 싱글CD의 수록곡 대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핏츠가 B-SIDES 앨범 花鳥風月를 제작하려고 했을 때, 커플링곡이 싱글에 수록되던 그 당시 미발표곡이 아니었을 경우,
그러니까 기존 곡의 라이브 버전이었거나 또는 기존 곡의 다른 편곡일 경우는 B-SIDES 앨범에 수록하지 않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빠진 곡이, うめぼし(Umeboshi, 매실장아찌)와 愛のしるし(Ai no Shirushi, 사랑의 표시) 두 곡의 라이브 버전,
그리고 지금 이 글의 BGM으로 흐르는 エトランゼ(TANAYAMIX) (Etranger TANAYAMIX, 에뜨랑제 타나야믹스)입니다.
ⅴ
스핏츠의 8번째 앨범인 フェイクファー(Fake Fur, 페이크 퍼)의 첫번째 트랙이 이 곡의 오리지날 버전인데
1998년의 원곡은 연주 시간이 1분 30초 남짓으로 그들의 노래 중 가장 짧은 노래인데 반하여
1999년의 타나야믹스 버전은 도리어 연주 시간이 가장 길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요.
● 또다른 エトランゼ myspitz story.. 바로가기
이 글을 쓰면서 수년 만에 이 8cm 싱글CD를 꺼내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이 타냐야믹스 버전의 エトランゼ(Etranger, 에뜨랑제)는 연주 시간이 가장 긴 노래인 것은 물론이고
스핏츠의 노래 중에서 노래 제목으로도 가장 긴 노래가 아닌가 싶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 
フェイクファー |
이 곡이 수록된 8cm 싱글CD의 부클릿 뒷면을 보면 2번째 트랙의 곡 제목이 エトランゼ(TANAYAMIX)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열어서 안쪽을 봐도 - 다른 곡과 달리 이 곡은 노랫말이 없긴 하지만 - 곡 제목은 역시 エトランゼ(TANAYAMIX)라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cm 싱글CD 자체의 겉면에는 이 곡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있다는 겁니다.
「エトランゼ(TANAYAMIX) 目を閉じてすぐ 浮かび上がる人 / ウミガメの頃 すれ違っただけの / 慣れない街を 泳ぐもう一度 闇も白い夜」
부클릿과는 달리, 싱글CD의 겉면에는 테두리를 동그랗게 말아가면서 3행으로 이루어진 노랫말 전부를 제목으로 붙여두었더군요.
마치 델리 스파이스의 명곡 차우차우 -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그렇게 노랫말 전부를요.
● エトランゼ 노랫말 살펴보기
ⅵ
제대로 듣지 않은 CD, 아직 첫장을 넘기지 못한 책, 쟁여두고 있는 DVD 등으로 시작된 이런저런 상념은,
미성년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년이 된지 한참인 최근까지도 여전했던, 음반과 책을 움켜쥐려고만 했던 자신을 떠올렸다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지만 결국 떠나보내려는 수백장의 LP와, 박스에 담긴 채 오랫동안 잊고지냈던 8cm 싱글CD에 잠깐 머뭅니다.
그러다가 스핏츠의 타냐야믹스 버전의 エトランゼ(Etranger, 에뜨랑제)까지 떠올리구요. ^^
요즈음 「사랑하는, 나의, 오랜 친구」가 스핏츠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유년시절부터 스핏츠가 익숙한 밴드이긴 했지만 저만큼 좋아한 것은 아니고 그저 '들리면 듣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앨범 저 앨범 예전의 앨범들도 찾아서 듣는 것 같고 DVD를 통해 P/V 영상이나 공연의 모습도 즐깁니다.
空も飛べるはず(Sora mo Toberuhazu, 하늘도 날 수 있을 거다)였나? 아직 서툴긴 하지만 어쿠스틱 기타로 퉁겨보기도 하더군요.
그 친구, 스핏츠의 음악을 파고들다가 이 타나야믹스 버전의 '레어 아이템(!)'도 발견하게 될지 어떨지 ^^* 은근히 궁금해지네요.
ⅶ
스핏츠의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시거나 또는 들어보긴 했지만 음반을 갖고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부클릿에 나와있는, 이 곡과 관련된 퍼스넬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エトランゼ(TANAYAMIX)
作詞 作曲 : 草野正宗
remixed by 棚谷祐一 with association of 伊藤俊治(ya-to-i) engineered by 太田桜子
棚谷祐一 farfisa organ, guitar and some electronic devices
伊藤俊治 programming, synthesizers 三輪テツヤ guitar |
키보드 플레이어 타냐야 유우이치(棚谷祐一)와 이토 토시하루(伊藤俊治) 그리고 레코딩 엔지니어 오타 유우코(太田桜子).
스핏츠와는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어 음반 작업에 참여한 것인지 또 어떤 뮤지션들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으음, 귀가시간이 늦어버렸네요. 이제 노트북을 덮어야겠습니다.
√ エトランゼ(TANAYAMIX) 노랫말(우리말 번역)의 출처는 (c) spitzHAUS 입니다.
√ 음악 파일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되었을 뿐이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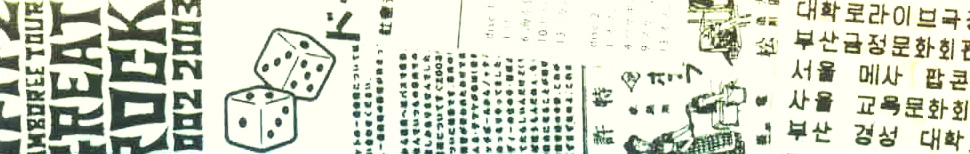
 | 관리자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