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インディゴ地平線 Indigo Chiheisen 인디고 지평선 |
ⅰ : 뭐야 이거 좀비잖아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처럼 아이맥스(IMAX)용 프린트로 상영되는 영화는 물론
대형 화면과 사운드를 즐길 만한 영화라면 저는 되도록 아이맥스관에서 관람하기를 즐기는 편인데요.
아이맥스관에서 다크 나이트를 보셨거나 아이맥스용 다크 나이트 예고편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면
일반상영관에서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임팩트 넘치는 화면과 사운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이삼천 원을 더 주고서라도 아이맥스관을 선호하는 것이지요.
2007년 겨울엔가 윌 스미스(Will Smith)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I Am Legend)가 개봉되었을 때
제가 그 영화를 CGV용산 아이맥스관에서 관람하기로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폐허 또는 정글처럼 변해버린 도심 속에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풍경이라든지
버려진 항공모함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 등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장면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의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후반부에 집중된 액션 신이 주는 위화감,
해피 엔드로 급하게 몰아가는 결말의 어이없음 등이 제가 실망한 이유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같이 본 친구에게 '뭐야, 이거? 좀비영화잖아?'라고 중얼거리게 되더군요. | 
나는 전설이다 |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사이언스 픽션'이거니 대충 짐작했던 정도였지,
흡혈귀, 뱀파이어와 유사한 느낌의 좀비들과 일당백의 사투를 벌이는 호러 무비인 줄은 보기 전에는 생각치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는 호러라든지 좀비라든지 그런 쪽 장르는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영화 나는 전설이다가 제게 별로였던 것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작 소설은 좋다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더군요)
'역시 좀비 영화는 별로야, 좀비 영화인 줄 알았다면 보러오지 않았을텐데'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스웨덴의 뱀파이어 영화 렛 미 인(Lat Den Ratte Komma In)은 지난 해 봤던 영화 중 제가 꼽는 베스트에 들어가고
칠백 페이지 가깝게 두꺼워도 브램 스토커(Bram Stoker)의 드라큘라(Dracula)는 주위에 일독을 권하고 싶은 소설이지만
영화나 책 광고의 한줄 카피에 흡혈귀, 뱀파이어, 공포, 호러, 하드고어, 스플래터, 슬래셔 그리고 좀비 등의 단어가 있으면
그런 영화나 소설은 '일단 다음에…' 하면서 뒤로 미루거나 또는 그렇게 미뤄두고는 잊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ⅱ : 좀비 전쟁의 구술 기록
이런, 딴소리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면 엔간해서는 손에서 책을 놓기가 쉽지 않은 소설을 한 편 읽었습니다.
맥스 브룩스(Max Brooks)의 소설 세계대전 Z(World War Z: An Oral History of the Zombie War).
자칫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다음에…' 정도로 뒤로 미뤄두고는 결국 잊고 지나갈 뻔 했던 소설인데요.
'세계대전' 어쩌구 하는 제목부터 (번역판 제목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원제까지도) 코웃음이 나왔는데,
게다가… '좀비'라니!
그래서 책 표지도 넘기지 않고 지나칠 뻔 했는데 부제에 있는 'Oral History'라는 표현에 눈길이 가더군요.
Oral History? 구술 기록? 역사적 증언?
전지구적으로 벌어진 좀비와의 전쟁이 거의 끝난 후 생존자와의 인터뷰 기록이라는 형식으로
인터뷰어의 질문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있는 세계 각국의 인터뷰이들의 답변으로만 이루어진 이 소설은,
그 개체수가 수억으로까지 불어나서 땅과 바다는 물론 심지어 바다밑에도 우글거리는 좀비들과의 전쟁을 소재로 하는데
좀비 자체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이나 좀비와의 전투 장면의 묘사보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대응하는 모습이나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문명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때 개인과 사회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그리고 사회의 변모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마치 실제인 듯 묘사해서, 호러 소설이라기보다는 좀비를 내세운 대체역사 소설을 읽고난 기분이 듭니다.
좀비들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여러 관점에서 보여주는 다방면의 지식도 상당한데
그것이 단순한 상상력의 결과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작가의 재능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소설의 모든 상황이 '좀비'라는 비현실적 존재와의 전쟁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좀비'스러운 상황과 자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인간사, 세상사를 돌이켜 보게 하는 소설이라
호러 소설 또는 공포 문학 등과 같은 장르적 명칭에 묶어두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소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 인용한 대목도 그렇습니다.
작가가 호의적으로 묘사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캐릭터를 통해 '경제'에 대한 생각의 어느 한 갈래를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굳이 좀비와의 전쟁이라는 비현실적 장치를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 느껴집니다.
선생은 경제에 대해 좀 아시오? 내 말은 전쟁 전 알짜배기인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해 좀 아냐 말이오. 그 경제란 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오?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안다고 떠들어 대는 놈들은 모두 헛소리를 하는 거요. 경제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과학적으로 절대적인 사실도 없소. 돈을 따는 것도 잃는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름과 같은 거지. 그나마 납득이 갔던 유일한 규칙은 워튼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역사학 교수에게서 배운 거요. 그 양반이 그러더군. '두려움.'
"두려움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그 한 방에 나는 그냥 맛이 갔지.
"텔레비전을 켜 봐."
교수님이 그러셨소.
"뭐가 보이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제군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우라지게 정곡을 찌른 말씀이었소.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지. 두려움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요.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 팔아먹을 수 있다. 그게 내 영혼의 진언이었소.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 맥스 브룩스의 소설 세계대전 Z 중에서. | 
세계대전 Z |
ⅲ : 두렵고 두렵고 두렵고 두려워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사느라 소식이 서로 뜸했던 친구에게서 안부의 문자메세지가 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던 문자메세지는 그날 밤 메신저의 대화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객쩍은 소리가 오가던 중, 지금 뭐하냐고 물으니 그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던 일을 접었다는 얘기를, 대화창에서의 '근황 토크' 중에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공연 쪽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는 지난 연말 이후 일거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고
현재 일정이 잡혀있는 것은 오월에 하나 정돈데 그것조차도 '돈 안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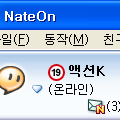 |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것 없이 엔간한 나라들 모두 끝이 안보이는 위기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여기저기서 다들 감원이다 감봉이다 긴축이다 해서 하루 뒤를 알 수 없으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비용이 아니면 다 줄이는 판에
없어도 먹고 사는데 별지장이 없는 '볼거리' 쪽의 일감이야 줄어들기는 제일 먼저고 다시 생기기는 맨 끝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세달 넘도록 일거리가 단 한 건도 없다니! 이 친구가 그 바닥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문득 맥스 브룩스의 소설 세계대전 Z, 앞서 인용했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 자신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팔아먹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인간은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까지 바뀌어가는 동안 단 한 건의 일거리도 없는 제 친구의 경우는,
제 친구가 팔고 있는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덮쳤던 지난 겨울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변했다는 것이겠지요.
'먹거리'가 위협받는 마당에 '볼거리'와 같은 상품은 더이상 구매하기 않아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그런 문화 상품의 구매는 이제 사치스러운 소비로 또는 눈쌀 찌푸리게 하는 낭비로 치부될 수 있다는.
 | 진부한 표현이 되겠지만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볼거리'나 '읽을거리' 같은 것은 마음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라는 말인데,
몸이 원하는 '먹거리'만 필요하고 마음이 원하는 그것은 더이상 필요치 않다면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 '좀비'들과 다를 게 뭐 있겠냐…,
알고보니 우리가 다름아닌 바로 그 '좀비'들이잖냐…,
어쩌면 얼토당토않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쓴웃음을 짓게 되더군요.
메신저 대화창을 사이에 두고,
저도 그 친구처럼 「알바몬」이라는 이름의 그 사이트 여기저기를 클릭하면서 말입니다. |
ⅳ : 꽁꽁 얼 것 같아도 거품이 되더라도
공연이나 전시회는 고사하고,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도 왠지 마음을 다잡아야 가능할 듯한 요즈음.
새벽이 될 때까지 말똥말똥한 채 있다가 네 시가 지나면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층을 표시하는 램프를 쳐다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고 하니까, 차라리 그 시간이면 배달되는 조간신문을 기다렸다가 배달되자마자 그거나 펼쳐보기 위해서죠.
그렇게 괜한 고민으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고 마음만 뒤숭숭한 요즈음, 새로운 느낌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스핏츠(スピッツ)의 일곱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 インディゴ地平線(Indigo Chiheisen, 인디고 지평선).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래였는데, 얼마 전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노랫말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들었는데요.
노랫말에는 신경쓰지 않고 그저 흥얼거리면서 들었을 때는 몰랐던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려니… 그 만큼은 아니고, '처진 어깨를 툭 쳐주는 듯한 정도의 다독거림'이라고 하면 맞으려나?
아무튼.
● 스핏츠의 インディゴ地平線(Indigo Chiheisen, 인디고 지평선), 열기
| インディゴ地平線
君と地平線まで 遠い記憶の場所へ
溜め息の後の インディゴ・ブルーの果て
つまずくふりして そっと背中に触れた
切ない心を かんで飲み込むにがみ
逆風に向かい 手を広げて
壊れてみよう 僕達は希望のクズだから
歪みを消された 病んだ地獄の街を
切れそうなロープで やっと逃げ出す夜明け
寂しく長ぃ道をそれて
時を止めよう 骨だけの翼 眠らせて
凍りつきそうでも 泡にされようとも
君に見せたいのさ あのブルー
君と地平線まで 遠い記憶の場所へ
溜め息の後の インディゴ・ブルーの果て
逆風に向かい 手を広げて
壊れてみよう 僕達は希望のクズだから
凍りつきそうでも 泡にされようとも
君に見せたいのさ あのブルー
少し苦しいのは 少し苦しいのは
なぜか嬉しいのは あのブルー | 인디고 지평선
너와 지평선까지 먼 기억의 장소로
한숨 쉰 후의 인디고 블루의 끝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척하며 살짝 등에 닿았다
안타까운 마음을 깨물어 삼키는 씁쓸한 맛
역풍을 향해 손을 벌리고
부서져 보자 우리들은 희망의 부스러기니까
뒤틀림이 지워졌던 병든 지옥의 거리를
끊어질 듯한 로프로 간신히 도망치기 시작한 새벽
외롭고 긴 길을 벗어나서
시간을 멈추자 뼈 뿐인 날개 잠재우고
꽁꽁 얼 것 같아도 거품이 되더라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저 블루
너와 지평선까지 먼 기억의 장소로
한숨 쉰 후의 인디고 블루의 끝
역풍을 향해 손을 벌리고
부서져 보자 우리들은 희망의 부스러기니까
꽁꽁 얼 것 같아도 거품이 되더라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저 블루
조금 힘겨운 것은 조금 힘겨운 것은
왠지 고마운 것은 저 블루
● インディゴ地平線 노랫말 (ふりがな 표기) | 
POCH-1605
1996-10-23
スピッツ
7th album
インディゴ地平線
track 03
インディゴ地平線 |
며칠 후 지하철 공덕역 출구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는 마포 공덕시장에 들어가 고등어김치찜과 계란찜으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메신저로 얘기 나누던 그날 밤, 차라리 이렇게 일 없을 때 느긋하게 얼굴 한 번 보자고 하길래 말난 김에 바로 약속을 잡았던 거죠.
점심을 먹고난 후 우리는 청계천 초입에 있는 어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 자살한 여배우 얘기라든지 우리네 살림살이와 무관한 얘기를 주고받을 즈음, 이제 슬슬 일어날 시간이구나 싶더군요.
그 친구는 '단기 알바' 일거리가 생길 것 같다면서 논현역 쪽에 있는 어느 회사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업인 일 말고도 가외로 웹사이트 제작에 재능을 가진 그에게 때마침 그 방면으로 단기간의 일감이 들어오나 봅니다.
바람까지 몹시 불어대는 꽃샘추위에 우리는 둘 다 어깨를 움츠린 채 지하철 광화문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힘겨운 시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그리고 딱히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긴 힘들지만…, 스핏츠가 노래하는 그 '블루'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 리 들 은 희 망 의 부 스 러 기 . 간 신 히 도 망 치 기 시 작 한 새 벽 . 외 롭 고 긴 길 .
꽁 꽁 얼 것 같 아 도 거 품 이 되 더 라 도. 너 에 게 보 여 주 고 싶 은 것 . 저 블 루 .
조 금 힘 겨 운 것 은 저 블 루 . 왠 지 고 마 운 것 은 저 블 루 . 블 루 . 인 디 고 블 루 의 끝 .
| √ 음악 파일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되었을 뿐이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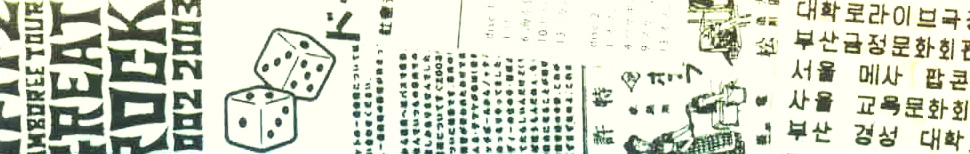
 | 관리자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