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迷子の兵隊 Maigo no Heitai 길 잃은 군대 |
ⅰ
풀어두긴 했지만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채 베란다 한켠에, 책상 아래에, 가구 들어선 자리 남은 한쪽 구석에 쟁여 둔 박스들.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은 이사한 지 두어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의 '주말 숙제'입니다.
그건 저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가 해야할 일의 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건망증까지 더해져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Queen
Greatest Video Hits 1 | 몇 해 전에 이사를 할 때 짐 옮기는 와중에 퀸(Queen)의 두 장짜리 DVD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CD, LP, DVD 등은 저의 정리 정돈 목록에서 뒤로 미뤄질 품목이 아니라서 미리 대충 정리를 마쳐 두었고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미뤄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소재 파악'은 제 머리 속에 되어 있었는데
유독 그것만 보이지도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질 않아 결국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무척 아쉬워 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주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삿짐을 풀어서 정돈하는 '주말 숙제'를 하다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배낭의 작은 수납공간 안에서 퀸의 그 DVD를 찾았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얼마 전의 그 '주말 숙제'는 애당초 몇 해 전에 했어야 했던 '주말 숙제'였던 셈입니다.
아무튼 '주말 숙제'는 이렇듯 발견의 기쁨, 아니 재발견의 기쁨을 맛보여 주기도 하는데
그 '재발견'은 저를 몇 해 전의 기억 속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예전의 추억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
이를테면 퀸의 DVD는 해운대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에서의 저녁으로 저를 보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층의 오피스텔에서 한동안 지내던 시절, 친구들이 찾아와 밤늦도록 담소화락에 흠벙덤벙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시간, 백그라운드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퀸의 그 DVD와 기타리스트 타카나카 마사요시(高中正義)의 DVD였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음악, 그 즈음 봤던 영화, 어떤 소프트웨어의 새로 알게 된 기능, 그 즈음 인터넷에 뜨고 있던 글과 그림 등.
그렇게 적당히 가벼운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들로 자정을 넘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 모두가 헤비 스모커였던 탓에 내내 켜두었던 촛불의 이미지가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생계 유지의 수단이 이대로 괜찮은지, 최소한의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고민도 그 날은 잠시 접어둔 채
오디오 스피커에서 퀸의 사운드가 흐르거나, TV 모니터에서 타카나카의 DVD 영상이 AV기기 광고용 화면처럼 흐르거나 그랬고.
ⅱ
재발견의 기쁨을 주는 그 '주말 숙제'를 하면서 그 기억 속으로 또는 저 추억 속으로 드나들다가 문득 느꼈습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저를 미성년의 시절까지 되돌려 보내는 '주말 숙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작정하고 굳이 찾아보려 해도 찾아지지 않을 듯 합니다.
미성년 시절의 저를 떠올리려면 이제는 온전히 기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 기분이 묘합니다.
어떤 나날에 대해서는 흐릿하거나 또는 훗날 다른 느낌으로 덧칠되었을 수도 있는, 어쩌면 스스로도 가끔 믿기 어려운 그 '기억'에만?
ⅲ
전투 ∼ 남진우
일군의 병사들이 숲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숲은 깊고 고요했다. 조만간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일군의 병사들이 숲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어쩌면 그들은 적군이었는지도 모른다. 곧 그들도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숲은 깊고 고요했고 다시 또 다른 일군의 병사들이 숲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어쩌면 그들은 적군의 적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병사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숲을 향해 들어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숲에서 나오지는 못했다. 숲은 깊고 고요했고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면 간혹 병사들이 행진하며 내는 북소리와 무기 부딪는 소리, 모닥불 옆에 앉아 주고받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전쟁이 끝나고 한 소년이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잎을 헤치고 덩굴을 걷어내며 조심조심 걸어가던 소년의 발에 무엇인가 밟혔다. 몸을 굽히고 들여다보니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칼이었다. 주워 드는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주위의 나무들이 일제히 술렁거렸다. 몸을 일으키며 둘러보니 사방에 수많은 병사들이 총과 칼을 겨눈 채 소년을 에워싸고 있었다. | 
세계의 문학 2008년 봄 |
ⅳ
예전에‥, 어느 시절엔가‥,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하재봉, 이문재, 박덕규,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름을 류시화라고 바꾼 안재찬 등,
읽고 있으면 기분 좋게 몽롱해지는 시를 썼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긴 했지만)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군의 시인들은 그들이 이십대 초반 시절에 결성했던 '시운동'이라는 문학 그룹의 동인들이었는데
앞에 인용한 시를 쓴 남진우도 그 '시운동' 동인으로 활동했던 시인이고, 이 시는 올해 봄에 어느 문학 계간지를 통해 발표한 시입니다.
「문학과지성 시인선」,「민음의 시」 등의 시집들이 책꽂이 한두 칸을 넘게 늘어나던 시절도 제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서점 계산대에 시집을 내밀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까마득할 정도로 시 또는 시집들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같은 것은 잊고 지낸지 오래라서, 한때 그가 쓴 시를 좋아했었다고 말하려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시를 읽자 남진우가 부러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른이 된 시인이 어느 날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칼'을 '주워 드는 순간'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 전부가 미성년 시절의 세계로 (또는 아예 유년의 나날로) 바뀌는 감성을 가진 시인이 부러웠습니다.
남진우가 묘사하는 '장난감 칼'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저에게는 없는데,
졸업 앨범이나 몇 장의 사진 말고는 미성년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데,
설혹 그런 것이 제게 있다 해도
시인의 감성처럼 사위가 스산하게 술렁거리고 제 자신이 누군가의 총칼에 겨누어지는 과녁으로 느껴질 만큼
긴장감이 충만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진 못할텐데.
ⅴ
주말이면 아니 주말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주말 숙제'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틈이 나면 주중이라 해도 짬짬이 해야 하는데 짬이 나는 대로 하기는 커녕,
그 '주말 숙제'에서 비롯된, 아마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약간의 탄식까지 동반한,
몇몇 상념에 빠져서 또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남진우의 시에서, 숲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린 병사들의 이미지가 단초가 되어
스핏츠(スピッツ)의 옛 노래 하나가 떠올라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逃げ込むのはいつも細胞の中
도망쳐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세포 속
‥ ‥ ‥
迷子の兵隊・・・
길 잃은 군대‥‥ |
| 
1994-09-21
スピッツ
空の飛び方 |
● 迷子の兵隊 노랫말 살펴보기
√ 迷子の兵隊 노랫말(우리말 번역)의 출처는 (c) spitzHAUS 입니다.
√ 음악 파일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되었을 뿐이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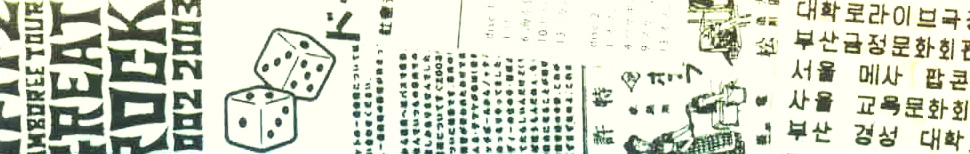
 | 관리자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