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떠다니는 일개 부초다 俺は朝鮮人でも、日本人でもない、ただの根無し草だ |
그 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일년 쯤 전이었나 봅니다.
친구 중에 일본어를 무척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소설책 한권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재일(在日, ざいにち)'를 다룬 소설인데 읽어보니 좋았다면서 제게 선물로 준다더군요.
소설 자체도 마음에 들어서였겠지만, 제게 일본어 공부를 해보라는 독려의 의미도 곁들인 듯 했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제가 그 책을 받아쥐고는 막연히 '일년 쯤 걸리겠네?' 했더니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일년 만에?' 하면서 깔깔거렸는데,
일년도 넘게 지난 지금, 그 책 카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의 GO는 책꽂이에 꽂혀있기만 하고
저는 일본어로 된 그 책을 아직도 (당연한 것이지만)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짐작대로 저는 그 책을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한 셈이 되었고
일년 쯤 지난 요즈음, 저는 선물로 받은 책 대신에 김난주의 우리말 번역본으로 읽고 말았습니다.
| 
GO |
GO는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제가 읽은 김난주의 번역본 역시 2000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저로서는 한참 늦게 읽어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한일 합작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니까 혹시 국내에서 개봉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
방금 전에 하늘에서 별이 흘렀다. 이 밝은 도쿄의 하늘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빨간 꼬리를 늘어뜨리고.
사쿠라이의 이마에 깊은 내 천자가 그려졌다.
"재수없어. 남자랑 있으면서 이렇게 부끄러워보긴 처음이야."
"부끄럽다고?"
"유성이잖아. 남자랑 둘이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유성을 보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딨어. 그렇지 않니?"
"그런가?"
"그렇지."
"그런가?"
"그렇다니까. 설마 무슨 소원같은 거 빌지 않았겠지?"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럴 틈, 없었어."
"아아, 다행이다."
사쿠라이의 이마에서 내 천자가 사라졌다. 대신,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온 얼굴에 퍼졌다.
"부끄러우니까, 유성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우리 둘 만의 비밀이야."
이런 경우, 내가 아닌 남자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
| 그렇다. 학교는 싫었지만 친구들과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 확실한 것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설사 그것이 아주 조그만 원으로 완결되어 있어 나를 답답하게 옭아매고 있다 해도 그 밖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
나는 소설의 힘을 믿지 않았다. 소설은 그저 재미있기만 할 뿐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책을 펼치고 덮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 도구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정일이는 늘 이렇게 말한다.
"혼자서 묵묵히 소설을 읽는 인간은 집회에 모인 백 명의 인간에 필적하는 힘을 갖고 있어." |
나는 말했다.
"애당초 국적 같은 거, 아파트 임대 계약서나 다를 바 없는 거야. 그 아파트가 싫어지면 해약을 하고 나가면 돼."
"일본 헌법으로 말하자면, 제22조 2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개인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조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문이야. 멋지자나." |
∼ 카네시로 카즈키의 GO 中에서 | 
GO |
재일교포 작가로는 김석범(金石範), 양석일(梁石日), 이양지(李良枝), 유미리(柳美里) 등 유명한 작가가 여럿 되지만,
카네시로 카즈키 이전에 제가 읽었던 작가는, 소설 금단의 땅을 쓴 이회성(李恢成) 정도 뿐이었던 듯 싶습니다.
(지난 시절 대학생들의 필독서 중 하나였던 소설 금단의 땅을 처음 읽었던 그 때의 느낌이 아직도 서늘하게 생생합니다.)
제게는 처음이었던 '재일(在日)' 작가 이회성으로부터 한참 뒤에 접하게 되는, 또다른 '재일(在日)' 카네시로 카즈키.
아직은 고작 그의 첫 장편소설 GO 하나를 (그것도 뒤늦게) 읽어봤을 뿐이지만,
소수민족, 한국현대사 그리고 '재일'에 대하여 무겁고 깊게 사색했던 이회성의 금단의 땅 그리고 유역 등과는 전혀 다르게,
카네시로 카즈키의 GO는, 뭐랄까요, 산뜻하면서도 느낌이 은근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가오는 소설이었습니다. |
사쿠라이는 내가 추천해준 대부분을 '멋있다'고 말해주었다. 부르스 스프링스틴, 루 리드, 지미 헨드릭스, 밥 딜런, 톰 웨이츠, 존 레논, 에릭 클립튼, 매디 워터스, 보디 가이‥‥‥. 그러나 닐 영만은 사쿠라이의 취향에 맞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다.
"참 내, 노래 잘 못하잖아." |
나 역시 사쿠라이가 추천해준 대부분을 멋있다고 생각했다. 마일스 데이비스, 빌 에반스, 오스카 피터슨, 세실 테일러, 덱스터 고든, 밀트 잭슨, 엘라 피츠제럴드, 모차르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드뷔시‥‥‥. 하지만 존 콜트레인만큼은 내 취향에 맞지 않았다. 사쿠라이가 이유를 물었다.
"너무 음침하잖아?" |
사쿠라이는 잭 니콜슨을 특히 좋아했다. 이유를 물었다.
"좀 독특하고 멋있으니까." |
| 존 어빙과 스티븐 킹, 레이 브래드베리는 내 마음에도 드는 소설가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 딱 드는 작품은 제임스 M 케인의『우편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와 레이먼드 챈들러의『긴 이별』이었다. 사쿠라이에게 그렇다고 말하자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했다. |
∼ 카네시로 카즈키의 GO 中에서 | 
GO |
김난주는 그의 남편 양억관과 함께 부부 번역가로도 유명한데,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 소설에서의 몇몇 부분이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에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란 한글 표기로 익숙한 Bruce Springsteen을 '부르스 스프링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에릭 클랩튼을 '에릭 클립튼', 무디 워터스 또는 머디 워터스로 익숙한 Muddy Waters를 '매디 워터스'로 표기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디 가이라고 한글 표기하는 뮤지션 Buddy Guy도 '보디 가이'라고 했더군요. (128쪽)
친구가 선물해준 책이 있기에 원문을 살펴보니, 원문에는 エリック·クラプトン, マディ·ウォ―タ―ズ, バディ·ガ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imi Hendrix의 Star Spangled Banner를 한글 표기로 '스타 스팽글 버너'라고 한 점 역시 눈에 거슬립니다. (103쪽)
이 경우 원문에는 'スタ―·スパングルド·バナ―'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 번역을 했는지 갸우뚱해집니다.
소설 속에서 인용되는 사람 이름이나 노래 제목 정도는 번역함에 있어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고 느슨하게 봐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난주는 전문번역가이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전문' 즉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Raymond Chandler의 소설 기나긴 이별(The Long Goodbye)을 '긴 이별'이라고 했는데 (130쪽)
국내에 이미 기나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나와있는 마당에 굳이 '긴 이별'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싶더군요.
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프리 건의 리더가 되었다느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가 '프리 건이 도대체 뭐지?' 싶었는데 이것은 훌리건(hooligan, フ―リガン)의 오역이 아닌가 싶더군요. (78쪽)
월드컵까지 치러본 우리나라이기에 이제 '훌리건'이란 단어는 더이상 낯선 단어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하나. '본슈에 살고있는 일본 사람'이란 부분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것을 넘어, 난감해집니다. (100쪽)
일본문학 전공자인 번역자가 일본 지명의 기초에 속하는 '혼슈(本州)'를 '본슈'라고 표기하다니. OTL.. |
지난 주 금요일 밤, 심야영화를 보러 나가던 길에 마주친 빗줄기, 오랜만에 내리기 시작한 그 봄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졌고
화창하게 개인 일요일, 베란다 창 너머로 봄비에 말끔히 씻겨진 초록의 풍경이 너무나 깨끗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나들이 나온 승용차들 때문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교통이 혼잡스러울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런 풍경이 눈을 싱그럽게 만들 때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

Neil Young
On the Beach
1974
Walk On
See the Sky About to Rain
Revolution Blues
For the Turnstiles
Vampire Blues
On the Beach
Motion Pictures
Ambulance Blues | See the Sky About to Rain
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the train, whistle blowin' through my brain
Signals curlin' on an open plain, rollin' down the track again
See the sky about to rain
Some are bound for happiness, some are bound to glory
some are bound to live with less, who can tell your story?
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the train, whistle blowin' through my brain
Signals curlin' on an open plain, rollin' down the track again
See the sky about to rain
I was down in Dixie Land, played a silver fiddle
Played it loud and then the man broke it in the middle
See the sky about to rain |
잠깐의 남산 드라이브도 좋았지만, 그 날 가장 좋았던 것은 늦은 오후에 들렸던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야외조각공원입니다.
인근의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에서 상춘객들이 봄나들이를 마치고 나오려고 할 즈음에 들어선 야외조각공원.
인근의 놀이공원과는 달리 호젓한 분위기의 야외조각공원. 잔디밭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어느 가족.
비록 자동판매기의 것이었지만, 호숫가에서의 커피 타임. 그 호수의 비단잉어들. 그리고 푸른 나뭇잎들 가득. |
남산으로 향하면서, 한강을 건너면서, 사당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현대미술관으로 가는 숲속 길을 천천히 오르면서
Govi의 기타 연주, 스핏츠(スピッツ)와 Bump of Chicken의 노래들, Jesse Cook의 스패니쉬 기타 연주,
그리고 Coldplay의 음반 Parachutes와 A Rush of Blood to the Head 등을 번갈아가면서 들었습니다. |
위에 인용하기도 한, 소설 GO의 어느 대목에서 언급되는 배우, 작가, 뮤지션들을 일별해보면
카네시로 카즈키의 취향과 제 자신의 취향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를테면 Lou Reed, Jimi Hendrix, Bob Dylan, Eric Clapton, Bill Evans 등.)
그 중에서도 저는 Neil Young에 대한 언급에 특별히 주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Neil Young은 제가 무척 오랫동안 좋아했던 뮤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카네시로 카즈키는 소설 GO에서 '나'의 추천을 통해 Neil Young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쿠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그가 '노래 잘 못하'는 뮤지션이라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물론 Neil Young은 음역대가 넓지도 않고 음색 또한 록 뮤직 씬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지요. | 
Neil Young |
하지만 소설 GO에서 언급한 '노래 잘 못하잖아'는 대목의 의미는 아마도 교과서적 의미에서의 그렇다는 것일테고
카네시로 카즈키는 Neil Young의 보컬에서 느낄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반어법(反語法)적으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Neil Young을 무척 좋아했던 저 마음대로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
어떤가요? 소설 GO의 '나'처럼 Neil Young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사쿠라이처럼 Neil Young은 '노래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취향에 맞지 않은가요? |
| √ 음악 파일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되었을 뿐이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
|
| | 2006/05/14 12:01 | 읽기 | trackback (0) | reply (28) |
| Tags : Bump of Chicken,
Coldplay,
Govi,
Jesse Cook,
Neil Young,
スピッツ,
金城一紀,
고,
금단의 땅,
김난주,
김석범,
양석일,
양억관,
우편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
유미리,
이양지,
이회성,
카네시로 카즈키 |
| Trackback :: http://www.myspitz.com/tt/trackback/11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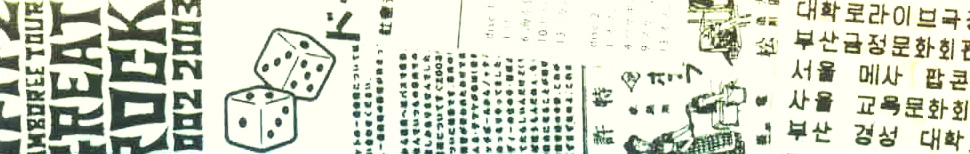
 | 관리자
| 관리자